지난날 그렇게도 슬프던 이별이 이제는 눈부신 자유를 뜻한다는 걸 알았다.
낭가파르바트(Nanga Parbat), 높이 8,125미터. 히말라야 8,000미터 급 봉우리를 향한 인류 최초의 도전이 시작된 곳이다. 1953년 첫 등정에 성공하기까지 58년간 무려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공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낭가파르바트는 ‘마(魔)의 산’, ‘킬러 마운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또 다른 이름인 ‘디아미르’는 ‘산 중의 왕’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낭가파르바트를 ‘운명의 산’이라고 부른다.
30년 전 낭가파르바트의 정상에 올랐던 한 위대한 인간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허덕이며 걷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해준다.
라인홀트 메스너는 이미 1973년에 낭가파르바트 단독 등정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검은 고독’이었다. 아래 인용된 부분이다. 한밤중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독’과 ‘온몸을 휘감는 공포’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다. 결국 등반을 포기하고 하산한다. 아내와 이혼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것이 시작은 아니다. 낭가파르바트와의 악연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 메스너는 동생 퀸터와 함께 낭가파르바트의 정상을 밟았다. 낭가파르바트는 그가 생애 최초로 등정에 성공한 8,000미터 급 봉우리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눈사태로 동생을 잃고, 자신도 굶주림과 악천후 속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구조된다. 이때 그는 심한 동상으로 발가락 6개를 절단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동생을 희생시켰다’는 세간의 오해를 묵묵히 견뎌야 했다. 7년 후, 그는 다시 홀로 낭가파르바트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이 고독감을 그곳에 묻어 버리든지 아니면 고독감이 나를 쓰러뜨리든지 둘 중 하나’라는 필사적인 각오와 함께.
"나는 산을 정복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다. 또 영웅이 되어 돌아가기 위해서도 아니다. 나는 두려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새롭게 알고 싶고 느끼고 싶다. 이 높은 곳에서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지탱해 준다. (…) 고독이 정녕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지난날 그렇게도 슬프던 이별이 이제는 눈부신 자유를 뜻한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체험한 흰 고독이었다. 이제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나의 힘이다."
"가파른 암벽을 오른다. 숨이 가쁘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온몸이 마비된 듯하다. 싸늘한 텐트 안인데도 몸에서 땀이 난다. 머리 위로 보이는 엷은 텐트 천에 서리가 엉겨있다. 혼자 소리를 질러 보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나를 둘러싼 공포가 온몸으로 느껴진다. 무서움에 계속 소리를 지르고 싶다."
"나는 지칠 대로 지치고 피로가 쌓였다. 헐떡거리며 숨을 쉬면 침이 흘러 턱수염에 얼어붙었다. 피켈에 기댄 이마가 뜨거웠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정신없이 쭈그려 앉았다. 귓전을 울리는 허파 소리와 점점 빨라지는 심장 고동 소리가 한꺼번에 머리를 울려 견딜 수가 없었다. (…) 여기서 다시 내려갈 수는 없었다. 그럴 만한 체력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올라갈 수 있을 뿐이고 또 올라가야만 한다."
"나는 그저 그곳에 앉아서 그 감정 속에 내가 녹는 대로 놔두는 길밖에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이 이해되고 의심이 생기지 않았다. 지평선 위에 가물거리는 희미한 빛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싶었다."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산악인이 있어. 남티롤 태생인데 국제적인 전위 등산가라고 하면 맞을 거다. 알프스의 가장 어려운 벽을 그것도 혼자 올라갔지. 6 대륙에 있는 최고봉 모두 등정했어. 낭가파르바트 등반길에서는 눈사태로 같은 등산가이던 동생을 잃기도 했어. 그는 그 자신이 산에 병들었다고 말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 고산에 오를 준비를 할 때마다 장비를 챙기면서 운다고. 무서워서 운다는 거지. 너무 무서우면 싼 짐을 다시 다 푼대. 하지만 얼마 지나면 또 울면서 다시 짐을 챙긴대. 그에게 산이란 무섭지만 가야 할 곳인 거야. 그래도 영 무서우면 다시 풀고, 다시 싸고…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떠난다는 거야. 그토록 무서우면 안 가면 될 것 아니겠니? 그렇다고 생각 안 해?”
(…)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해?”
“모르겠니?”
“…."
“엄살 그만 부리라는 얘기야.”
“엄살?”
“그게 아니면 지금 뭐야? 누구에게나 무서워 울면서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 메스너한테 산 같은 게 누구한테나 한 가지씩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 말이야.”
- 신경숙, 「멀리, 끝없는 길 위에」(『풍금이 있던 자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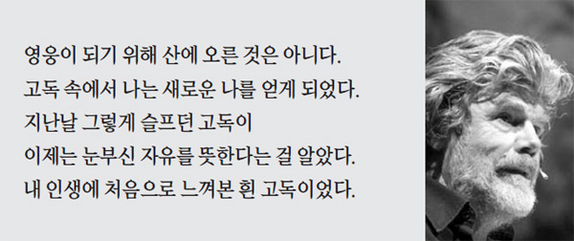
참고
'개발자의 서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박상형 에세이 (0) | 2020.08.18 |
|---|---|
|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법 (0) | 2020.08.14 |
|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글 그림 - 김수현 (0) | 2020.08.06 |
| 더 해빙 -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 (2) | 2020.08.03 |
| 여덟 단어 - 박웅현 (1) | 2020.07.15 |
|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엉터리 가치들 (0) | 2020.07.13 |
| 그림은 금방 능숙해지지 않는다 - 개인 맞춤형 그림 트레이닝북 (0) | 2020.07.08 |
| 구름들의 송년회 - 김경미(김미숙의 가정음악 작가) (2) | 2020.07.03 |
취업, 창업의 막막함, 외주 관리, 제품 부재!
당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 실패만 반복하는 외주 계약,
아이디어는 있지만 구현할 기술이 없는 막막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한 학습, 실전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고민을 멈추고, 캐어랩을 만나세요!
코딩(펌웨어), 전자부품과 디지털 회로설계, PCB 설계 제작, 고객(시장/수출) 발굴과 마케팅 전략으로 당신을 지원합니다.
제품 설계의 고수는 성공이 만든 게 아니라 실패가 만듭니다. 아이디어를 양산 가능한 제품으로!
귀사의 제품을 만드세요. 교육과 개발 실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세요.
캐어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