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픈 후회
- 황지우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완전히 망가지면서
완전히 망가뜨려놓고 가는 것; 그 징표 없이는
진실로 사랑했다 말할 수 없는 건지
나에게 왔던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내 가슴속엔 언제나 부우옇게 이동하는 사막 신전;
바람의 기둥이 세운 내실에까지 모래가 몰려와 있고
뿌리째 굴러가고 있는 갈퀴나무, 그리고
말라가는 죽은 짐승 귀에 모래 서걱거린다
어떤 연애로도 어떤 광기로도
이 무시무시한 곳에까지 함께 들어오지는
못했다, 내 꿈틀거리는 사막이.
끝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그 고열의
신상(神像)이 벌겋게 달아올라 신음했으므로
내 사랑의 자리는 모두 폐허가 되어 있다
아무도 사랑해본 적이 없다는 거;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한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젊은 시절, 내가 자청한 고난도
그 누구를 위한 헌신은 아녔다
나를 위한 헌신, 한낱 도덕이 시킨 경쟁심;
그것도 파워랄까, 그것마저 없는 자들에겐
희생은 또 얼마나 화려한 것이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걸어 들어온 적 없는 나의 폐허;
다만 죽은 짐승 귀에 모래의 말을 넣어주는 바람이
떠돌다 지나갈 뿐
나는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믿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다.
1980년대 황지우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사건이었다. 1983년 그의 첫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세상에 내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시를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말장난으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격렬한 풍자와 야유, 질타와 저주, 냉소의 언어들을 버무린 그의 시를 '형태 파괴의 시'라고 단순화시키기도 했다. 어느 여름날, 그를 만나러 담양 명목헌으로 달려갔지만 부재하는 그를 만나지는 못하고 명목헌 앞 연못에 드리워진 목백일홍의 붉은 색깔에 넋을 놓아버렸다. 그래서 나에게 황지우는 명목헌 목백일홍이다. 겉으로는 한없이 화려해 보이지만 낙화가 만드는 슬프고 지친 풍경의 얼굴로 가슴을 멍하게 만든다. 가차없이 내리치는 그의 칼날에 우리들 삶은 난도질당한다. 그런데 시원하다. 그래서 활짝 웃는다. 실컷 웃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린다. 그게 황지우의 시다.
황지우의 시가 세상에 나온 지 30년이 넘어가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말들로 시끄럽다. 매일 매스컴을 채우는 말들,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 확인하는 건 쉽지가 않다. 대부분 말에 그친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 아예 달이 아니라 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은 망가진 어휘의 더미들로 가득하다. 하나의 단어가 지니는 의미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문제는 악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아름다운 어휘조차 망가져 버린 예도 허다하다. 말의 본질이 무너지면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기보다는 함께 비를 맞고 싶은데 나는 무력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모두 폐허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진짜 쓸쓸해졌다. 표현을 수정해 봤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였다. 그래도 쓸쓸함이 줄어들진 않는다. 무엇이 문제일까?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자신만의 폐허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라는 것이 반드시 '사람'만은 아닐 게다.
'나는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 절박하다. 솔직히 말하면 시인처럼 뼈아프게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절박하다.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시간이란 괴물은 매순간 현재의 길을 걷는 나를 압박한다. 몸서리를 치면서 거부의 몸짓을 보내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달려가는 시간에 보폭을 맞추지 못한 나는 자꾸만 뒤로 밀렸고 절박함이 절박함을 밀어내는 반복 속에서 여기까지 다다랐다. 이제는 조금씩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 '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컴퓨터 D드라이브에 '이제는 마무리'라는 파일방을 만들었다. 작은 후회들이야 없지 않았지만 최소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에 대해 내가 지닌 정성을 다했다.
'이제는 마무리'라는 방을 마련했지만 사실은 '끝'에 대한 정리도, '끝' 다음에 대한 준비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다. 둘러싼 모든 것들은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에 멈춰 서서 멍하니 바람만 만지고 있다. 바람조차 만질 수 없는 시간도 언젠가는 다가올 테니 행복한 거 아닌가? 최소한 '나는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믿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다'는 황지우보다는 행복하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절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통해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나와 더불어 걸어가는 사람도 있음을 믿는다. 무너지는 담벼락 아래의 절박함도 많았다. 더 절박할 수 없을 만큼의 절박함도 그 절박함으로 견뎠다. 지옥 같은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으로 견뎠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내 깜냥으로 감당할 수 없다. 내 몫이 비록 아픔과 슬픔뿐일지라도 사실은 그 선택조차 내 몫이다. 이제 곧 목백일홍이 필 게다.
- 한준희 대구시교육청 장학사 [한준희의 문학노트] 매일신문 2016-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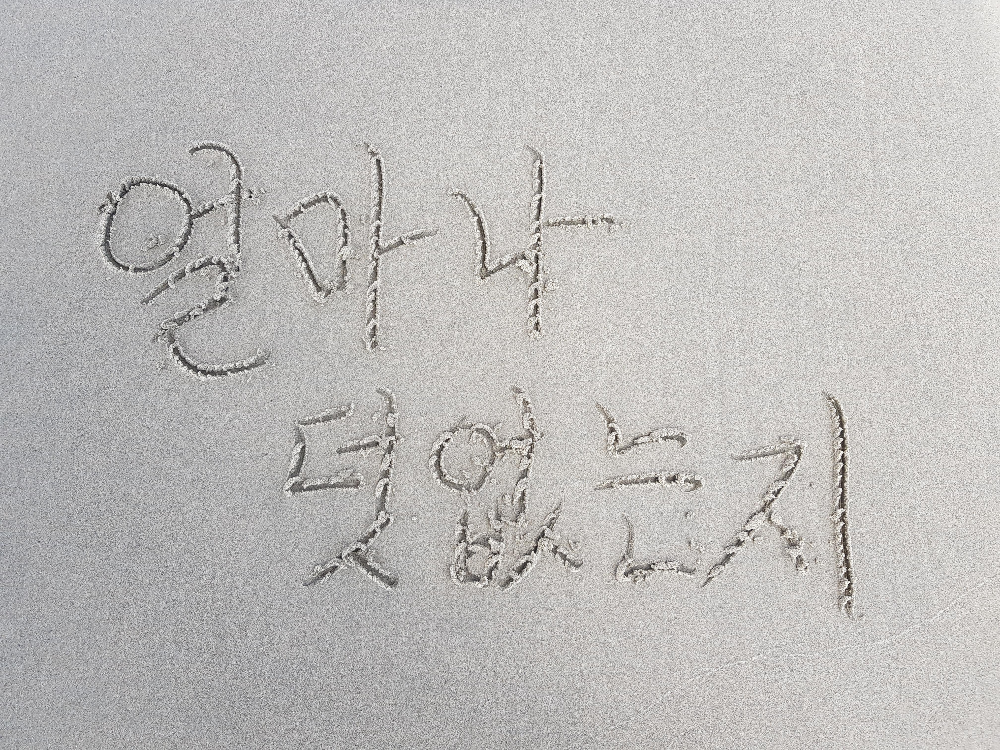
'좋은 글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계성 인격 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1) | 2022.08.12 |
|---|---|
| 반사회성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1) | 2022.08.09 |
| 헤르만 헤세의 문장들, 헤르만 헤세 저 (1) | 2022.08.08 |
| Linkin Park - In The End 가사 (0) | 2022.08.05 |
| 친절해라. 네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0) | 2022.07.21 |
|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음식을 사용하는 방법 (2) | 2022.07.18 |
| 유발 하라리의 위험한 포퓰리즘 과학 (1) | 2022.07.15 |
| 9가지 지능 유형 (2) | 2022.07.06 |
취업, 창업의 막막함, 외주 관리, 제품 부재!
당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 실패만 반복하는 외주 계약,
아이디어는 있지만 구현할 기술이 없는 막막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한 학습, 실전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고민을 멈추고, 캐어랩을 만나세요!
코딩(펌웨어), 전자부품과 디지털 회로설계, PCB 설계 제작, 고객(시장/수출) 발굴과 마케팅 전략으로 당신을 지원합니다.
제품 설계의 고수는 성공이 만든 게 아니라 실패가 만듭니다. 아이디어를 양산 가능한 제품으로!
귀사의 제품을 만드세요. 교육과 개발 실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세요.
캐어랩



